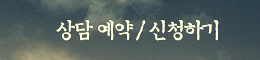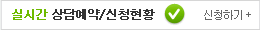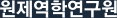숭례문 현판은 가로일까 세로일까. 정답은 세로. 동대문 등은 모두 가로인데 남대문만 세로다. 이유는 간단하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서울은 관악산의 화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 숭례문은 화기(火氣)를 제압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이다. 숭(崇)은 높인다는 뜻이고 예는 음양오행 중 불(火)에 해당한다. 선인들은 이열치열의 논리로 불에 대항하려 했던 것이다. 최근 출간된 〈역사를 움직인 풍수 이야기〉(웅진출판·정종수 지음)는 고려와 조선 건국에 얽힌 풍수 이야기를 다룬다. 문화재관리국 학예관인 저자는 역사를 움직인 또 하나의 권력으로서 풍수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한다.
우선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 설화를 보자. “도선이라는 스님이 개성 융건의 집에 이르러 ‘기장 심을 터에 삼을 심었구나’하면서 혀를 찼다. 기장 제(禾祭)자는 군주 제(帝)와 음이 같다. 도선은 왕이 태어날 집이란 것을 암시한 것이다. 깜짝 놀란 융건이 도선을 쫓아갔다. “백두산의 기운이 마두명당에 이르렀으니 서른여섯 칸짜리 집을 짓고 내년에 아들을 얻으면 이름을 왕건이라 해라.” 과연 도선의 예언대로 왕건이 태어났다.
풍수에서는 초승달 모양의 땅을 길지로 친다. 초승달은 점점 커져 만월이 되기 때문이다. 좌우로 예성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는 개성은 초승달을 닮았다. 그러나 천하명당에도 약점은 있게 마련. 조선시대 학자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개성의 산세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다.
풍수에서 좌측인 청룡은 문(文)과 장자를, 우측인 백호는 무(武)와 차자를 상징한다. 개성의 경우 우측이 좌측보다 높았기 때문에 무신이 발호했다”라고 기록했다. 고려말 무신정권이 득세했음을 상기할 때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려인들은 탑을 세움으로써 액운을 막고 상서로운 기운을 간직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도참설이 유행하기 전 신라의 탑은 모두 3층이었다. 그러나 3층은 잡귀를 막기에 너무 낮았다. 고려인이 5층탑을 짓기 시작한 것은 다분히 풍수적인 것이었다.
시간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이 땅의 기운이다. 고려말 국운이 쇠퇴하자 왕실은 남경(서울)의 삼각산(북한산)이 개성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남경천도론이 제기돼 현재 청와대 자리에 궁을 짓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남경천도론에 이어 이씨가 남경에 도읍할 것이라는 도참설도 퍼졌다.
혼비백산한 조정은 이씨의 왕기를 누르기 위해 남경에 이씨를 상징하는 오얏나무를 심어놓고 이씨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베어버리도록 했다. 또 왕이 매년 남경을 방문, 지금 경복궁터에 임금의 옷을 묻어 서울의 지기를 억누르려 했다.
고려시대는 지기쇠양설 등 주거풍수가 유행했으나 조선시대는 묘지풍수가 인기를 모았다. 조선조 임금의 무덤 중 제1명당은 세종의 영릉. 풍수가들은 영릉 때문에 조선왕조가 100년 더 연장됐다고 입을 모은다. 풍수의 모든 이론을 결집한 것이 왕릉이지만 도읍지 선정도 매우 중대한 분야다.
기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는 원래 신도(新都)로 계룡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바람개비 형상 한가운데 위치한 계룡산은 이상적인 땅이었다. 그러나 신료들은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데다 해안에서 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성계는 토목공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중단하고 말았는데 당시 궁궐터 주춧돌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궁궐 위치에 관한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논쟁도 유명하다. 무학대사는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경복궁을 동향으로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정도전이 “자고로 제왕은 모두 남쪽으로 궁을 건설했다”며 “한강이 화기를 막아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무학대사는 “도읍을 정할 때 중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연장될 것이나 정씨의 말을 들으면 5대가 가기 전 혁명이 일어나고 200년 못가 나라가 흔들릴 난리가 일어난다”고 예언했다. 실제로 개국 후 세조의 왕위찬탈 등 변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개국 200년인 1592년엔 임진왜란까지 발생,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도읍지 선정에 관해 재미난 일화가 또 있다. 태종의 오른팔이었던 하륜은 서대문 밖 무악벌을 궁터로 추천했다. 무악벌은 현재 무악재 왼편 서교동 연희동 동교동 일대. 명당임에 틀림없었으나 주산인 뒷산이 너무 낮고 땅이 좁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가 많았다. 태종은 북한산 아래 궁터를 잡으면서도 무악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훗날 여기 도읍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아쉬움을 달랬다. 어쨌든 현재까지 최규하(서교동), 전두환·노태우(연희동), 김대중(동교동) 등 대통령 4명이 이곳에서 나왔다.
조선 명종 때 풍수지리가 남사고의 말도 들어볼 만하다. 남사고는 “서울의 동쪽 낙산(동숭동 뒤쪽 이화여대 대학병원 쪽으로 흘러내리는 산)과 서쪽의 안산(인왕산)이 서로 대치하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로 인해 조정이 당파를 지어 동서로 나뉘는데 동쪽 낙산의 낙(駱)자를 풀면 각마(各馬)가 되므로 동인은 갈라지게 되고 서쪽 안산의 안(鞍)자는 풀면 혁안(革安)이 되므로 서인은 혁명을 일으킨 후에야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고 서인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이후 비로소 안정됐으니 글자 풀이가 절묘하게 맞은 셈이다.
풍수와 정권교체의 연관성을 다룬 이야기도 많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도성에 연못을 만듦으로써 화기나 살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사대문 부근에는 인공연못이 많았는데 서대문 밖 서지에 연꽃이 만발하면 서인이 득세하고, 동대문 밖 동지에 연꽃이 성하면 동인이 성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순조 23년 남대문 밖 상인들이 돈을 추렴, 마른 연못에 물을 채우자 그 해 남인의 거두 채제공이 등용되었다. 광화문의 해태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의 화재를 막기 위해 세운 것이다.
관악산의 화기가 궁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봉에 샘을 파고 구리 용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동서남북 중 북문이 없는 것은 북문을 통해 음기가 들어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동대문의 원 명칭 흥인문에 지(之)자를 추가, 흥인지문이라고 한 것은 산맥 모양의 之자를 넣어 동쪽의 지기를 돋우기 위함이었다
출처 : 風水地理(풍수지리) - blog.daum.net/choitj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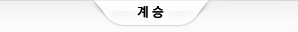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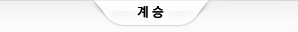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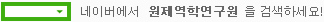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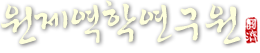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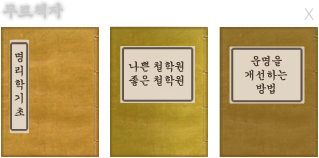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