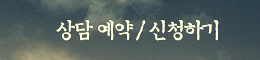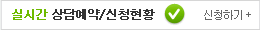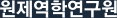죽어보지 않아 죽음을 알지는 못한다.
계축날이 문득 홀연히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 쟁이는 쟁이인가 보다.
오전에 에이에스 상담하고 상담한 분이 미안했는지
손님을 소개해 넘의돈 구경하고 밀린 숙제하고 내일일
준비하다 보니 점심때가 되어 밥은 챙겨 먹었다.
육회를 유난히 잘드시고 좋아하는 우리 샘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배가 고픈것도 모르고 졸리운 것도 모르고
거시기 할때도 모르고 그져 궁구한 것이 있으면 해결하기에 급급하시다.
금수식신이 토다하여 도식하였으니 한덩치하는 몸이
토수로 정체가 되어 불편해 보이는 몸을 날렵하다 여기시고
보는 이로 하여금 민망한데 맑은 미소를 지으시니 알수없는 노릇이다.
토극수하면 수가 깨진다는 분도 계시고,
토극수하면 토가 읍는 금을 거쳐 성급히 수로 간다는 분도 계시고,
토극수하면 토와 수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여 말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토극수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가 보다.
수가 깨진다는 말은 수입장에서 克을 말한 것이고,
土는 剋하는 입장에서 가해자적인데서 나오는 가설인가 보다.
토가 읍는 금을 거쳐 수로 간다는 것은 상극을 상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토생금하고 금생수하는 생장수장에서의 수장적인 관점인지,
剋하는 토입장에서 통변하기 보다는 克당하는,
水입장에서 土극水를 설명해 보려는 가설로 보인다.
토생금 금생수에서 토는 변화를 주도하는 매개이니,
금생수하는데 토극수는 타이밍을 조절한다는 의미도 포함될 것이다.
토는 목화에서 금수를 변화하고 조정능력을 가진 것도 있고,
목에서 화로 금에서 수로 변화하는 조절능력을 가진 것도 있다.
이런 토라는 매개는 수를 직접적으로 극하기 보다는
변화하려는 오행을 수렴하여 변이과정으로 음양의 균형을 조절한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는 토가 밀접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음양으로 보면 토극수는 가설일 뿐이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중에 곰이 있다. 곰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충분한
영향흡수를 하고 겨울내내 잠만 잘 수 있다. 뱀, 거시기, 또 거시기,
토극수는 수중심에서 보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같다.
토중심에서 보면 영양을 충분히 비축하고 자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소모할 수 있는 자생능력과 자율 유지능력을 갖춘 상극관계이다.
적천수에서는 토극수를 조심스럽게 예시하고 거론하였는데
현대에서는 너무 단편만 보고 단순화 시키지 않았나 조심스럽다.
하여간 토극수 도식은 타 오행과 같지 않음을 제시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잔다. 평온속에 자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는
숨을 쉬는지 가슴팍에 심장이 뛰는지 몸이 따뜻한지로 알수 있다.
형체는 있는데 죽어있고 숨은쉬고 심장은 뛰고, 몸이 따뜻하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숨은 멈고, 심장도 멈추고,
몸이 차갑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다.
토극수는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호흡과 같고, 심장의 박동과
온기가 흐름으로 산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함부로 토수의 관계를 건드리면 수도 망가지고 토도 망가진다.
이런 상호 작용은 목이 하는 것이다. 이때 목은 소토하는 용도를 가진다.
수는 토로서 체가 되어 용도가 생성되어지고,
수는 목으로 성장성을 가지나 결국 토의 체가 되어 용도가 생성된다.
수생목이면 목극토로 목의 체로서 토는 용으로 작용하고,
토를 체로 하여 수는 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살펴 목을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목극토가 우선인지 토극수가 우선순위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밸런스가 무너지면 몸은 병이 나고 아프고 거시기 하는 것이다.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수는 단순히 원인에 불과한 단순논리이다.
당연히 오행 전체의 상호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상극되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와.
설되는 목설화, 화설토, 토설금, 금설수, 수설목, 목설화를 궁구해야 한다.
앞서 생과 사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목화에서 금수로 소모되는 것이고,
금수는 목화로 소모되는 것이다. 목은 화로 소모되고 금은 수로 소모된다.
목금은 수화로 소모되는 것으로 죽음에 이르고,
수화는 상극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양은 설기되어 소모되는 것으로 죽음에 이르고
음은 상극되어 꺽어지고 넘어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
단순히 상극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설기되고
소모되어 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어찌 알겠는가 죽어봤어야지.
그러나 현장경험으로 이런 것은 찾아 내었다.
설기되어 소모되는 것도 그 양과 정도가 있는 듯 하고,
상극되어 꺽어지고 넘어지는 것도 그 횟수와 정도는 있는 듯 하다.
의문의 돌연사나 죽음에는 진술축미가 있다.
갑부터 갑술, 갑진, 을축, 을미...계축, 계미까지 20개다.
신살로 백호대살이 공통점이 있긴 한데 이것의 작용력이
어디까지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에서 다시 의문점은 든다.
토는 보이지 않는 지구 대기권의 인력과 같고,
의식이 안되는 공기와 같아서 있는듯 없는듯 음양을 조절한다.
인신사해는 설기되는 것으로 죽음에 이르니 꽃처럼 나무처럼
목이 말라 시들어 고개를 숙여가고 푹꺼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술충미는 沖하고 刑하는 것으로 쏟구치고 푹꺼지는데
회호리 바람처럼 때로는 수영장 물빠지듯 쑥 휘말리고 휘감기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행간에서는 입묘라는 것으로 표현한다. 나는 모른다.
자오묘유는 배부르게 하거나 배고프게 하여 상극되면 곤란하다.
허약할때 상극하면 파료가 되고 왕강할때 상극하면 흉폭성이
배가 되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다.
팔자가 나이고 일간은 팔자의 주체인 나가 되고,
월은 시절속에 있는 나가 되어 본능과 습성을 살피게 되고,
어느것 하나 팔자안에 나 아닌것이 없으니 팔자가 나인 것이다.
대운과 세운과 월과 일진은 팔자를 동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객체가 되니 원인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팔자에 원인과 인자가 없는 것을 운에서 찾는 것은 무모한 것이고,
죽은 사람 옆에있는 사람에게 싸잡아 죽었다고 하면 곤란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산사람은 살았으니 사는 것이 고행이고 고통이다.
행복은 불행이 없었다면 논의 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건강은 아픔이 없었다면 논의 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산다는 것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다.
산다는 것에 진리는 있는데 의식을 부여하고자 하니
인간에게는 육신이라는 미묘한 감정과 시비가 교차되고
희노애락과 만감이 늘 교차하는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노자의 無爲自然의 삶처럼
아침에 눈뜨면 새롭게 태어난듯이 살아가고,
밤에 눈을 감으며 죽음을 준비하는 듯이 살아 가는 것이다.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대자연의 질서를 인지하지 못하니
자기 안에 갇혀사는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고,
자아를 인식하지 않으면 대자연의 질서를 인지하고 편승하니
넓은 세상속에 나가 되어 동화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죽음에 관하여 결론은 모른다.
죽음이라는 어휘에 뜻도 모르면서 거론한 것이 부끄럽다.
하물며 오행을 모르는데 육신을 어찌 안다 할 것인가.
무인성이 무위하는 것과.
인성만땅이 무위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인연이 얽매이지 않는 무인성이 인연을 찾아 헤메고,
인연이 되어 인연을 서운하게 하고 휑하니 사라지고,
인성만땅이 인연에 얽매여 집착하고 의지하여
인연을 원망하고 아프게 하며 외롭고 쓸쓸하다 투정한다.
재성은 세상인데 재극인하여 재로서 완성되는 인성이야
말로 참다운 무위자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道가 아닌가 싶다.
출처 : 죽음에 관하여 - blog.daum.net/024614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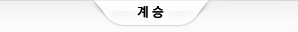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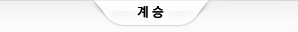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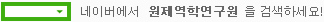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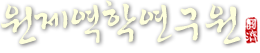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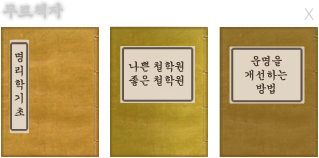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