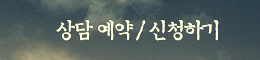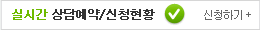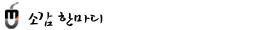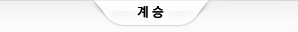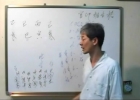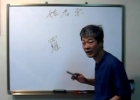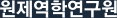<창작사주이야기22> 십이지 관점 - 오(午), 미(未)
페이지 정보
본문
午
|
NO |
출처 |
내용 |
물상/특징 |
|
1 |
상형문자
(설문해자)
|
① 똑바로 세운 절굿공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
② 절굿공이 같은 막대를 꽂아 한낮임을 알았다는 데서 ‘낮’을 뜻함. |
절굿공이, 낮
(質)
|
|
2 |
三命通會 |
午는 봉후(烽堠). 正南方에 위치하며 火 ․ 土에 屬하고 그 色이 赤黃이라 봉후라 함.
午는 말도 되고 봉화(烽火)불도 되니, 즉 戰爭에 쓰는 말과 兵火가 있는 곳. |
봉화가 올려지는 성곽(제단)
(質)
|
|
3 |
사주학 기초
(리지청) |
① 절굿공이를 본뜬 모양.
② 절굿공이처럼 ‘교차한다’는 의미가 있음. ‘오’라는 소리는 五에서 빌린 소리인데,
五(다섯 오: 십진법에서 전반과 후반과의 교차하는 수)와
互(서로 호) 서로 어긋나게 교차 하다는 소리와 뜻과 관련 있음.
③ 관련한자로는,
仵(검사할 오) 忤(거스를 오) |
절굿공이, 교차
(質)
|
|
특징 |
1. 3가지 관점 모두 다른 지지 설명에 비해 일관성이 있음.
2. 낮, 봉화, 불 등은 의미가 연결됨. | ||
未
|
NO |
출처 |
내용 |
물상/특징 |
|
1 |
상형문자
(설문해자) |
① 나무 끝 가느다란 작은
가지의 모양을 본뜬 글자.
② 나중에는 ‘분명하지 않다’, ‘희미하다’, ‘못 미치다’의 의미 지님. |
작은 가지,
불분명, 희미함,
못 미침
(質)
|
|
2 |
三命通會 |
未는 화원(花園). 未가 花園이 되고 卯가 花園이 되지 않는 것은, 卯는 木이 旺해 스스로 수풀을 이루지만 未는 木의 庫라, 사람이 담을 쌓고 여러 꽃을 심은 것과 같으니 未中에는 여러 가지 雜氣가 있기 때문. |
화원
(質)
|
|
3 |
사주학 기초
(리지청) |
① 나무가 매우 무성한 모양. 그래서 털이 무성한 양과 연결
또한 ‘미’라는 소리는 양의 울음소리 메에서 빌린 소리.
② 未는 木보다도 ‘무성하여’ ‘아직도’ 나뭇잎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부정의 뜻으로 쓰게 되었음.
③ 味(맛볼 미)
美(아름다울 미) 米(쌀 미) |
무성한 나무, 양, 아직 그대로인
상태
(質)
|
|
특징 |
1. 기본적으로 ‘무성하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함. | ||
출처 : <창작사주이야기22> 十二支物象, 通卽久! - blog.daum.net/twinstar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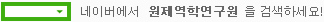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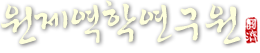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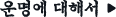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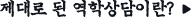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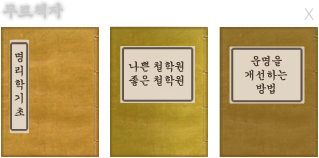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