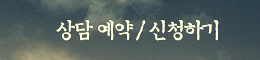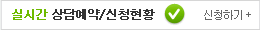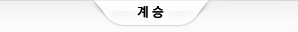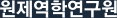뒤늦게 부르는 사부곡 ‘아배 생각’
페이지 정보
본문
뒤늦게 부르는 사부곡 ‘아배 생각’
명리학이 살펴놓은 사주팔자에는 십성이라는 게 있다. 말하자면 부, 모, 형, 제, 처, 자 등 육친을 헤아리는 법방이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글자는 어머니, ‘나와 비슷’하면 형제, 여자의 경우에는 ‘내가 도움을 주는’ 글자가 자식이다. 그런데 그 많은 글자 중에 하필이면 ‘내가 극(克)하는’ 성분의 글자가 아버지를 뜻한다니 뜻밖이다. 아버지를 이기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듯하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지고 나면 강을 건너는 순서만 남는다.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 그것이 순리다.
아버지는 화전민이었다. 소개령이 떨어져 쌀과 좁쌀 두어 되 보듬은 어머니와 자식 셋 이끌고 도시로 나와 밑바닥 인생을 걸었다. 채소 장수, 닭 장수, 막걸리 배달꾼 등을 하며 돈도 좀 마련하고 가게도 차려 사는 것처럼 살아본 세월이 얼마였나. 이내 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지자 가계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삼년 와병 끝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죽어라고 입을 벌리며 짹짹거리는 자식새끼뿐이었다.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고 아버지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면 된다고 정호승 시인이 말했던가. 어머니의 조각을 다시 붙일 수 없었듯이 아버지의 인생은 평생 조각난 채로 적자 인생으로 사셨다. 그렇게 좋았던 새어머니를 비명에 잃고, 성격이 유난해서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세 번째 새어머니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더하셨다.
흩어져 살던 자식들이 아버지의 근처로 모여 살 즈음, 아버지의 조각난 삶은 그 정도로도 모자랐던지 완벽히 부서지고 말았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석 달 식물인간으로, 다섯 해를 기억상실로 살다 가셨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선 부지런한 모습이 떠오른다. 온 집안 대소사는 모두 아버지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온 집안 어른들이 안타까워한 것도 그만한 일손을 집안에서 다시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당신 일도 마찬가지였다. 새벽에 논밭일 다 하고 아침에 출근해 온 동네 막걸리를 배달하고, 낮에는 농사, 저녁에는 다시 배달로 이어지던 일상이 사고를 당하는 날까지 하루 같았다.
지지리 복이 없고 가난한 아버지였지만 성격만큼은 낙천적이고 유머가 풍부한 분이셨다. 마을에서 관광버스를 맞춰 단풍놀이를 갈 때도 아버지가 유고 중이면 미뤘다. 단풍길이 빙판길이 되어도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을 좋아했다. 신명나고 재미있고 친화적인 아버지는 어떤 자리보다도 오남매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아버지의 개인기를 최상의 것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코로 젓가락을 타면 모든 악기 소리가 났다. 온몸이 악기였다. 노래는 또 얼마나 구성지게 넘기셨는지.
인심 좋고 부지런하고 낙천적이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과 평생을 같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 아버지를 오히려 이기려고만 했으니 후회막급이다. 농림고에 가라고 하실 때 인문계를 선택했으며, 시를 쓰면 굶어죽는다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라고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파렴치하게도 그렇게 배운 시로 아버지를 돌이켜 보자면 이렇다.
뻔질나게 돌아다니며/ 외박을 밥 먹듯 하던 젊은 날/ 어쩌다 집에 가면/ 씻어도 씻어도 가시지 않는 아배 발고랑내 나는 밥상머리에 앉아/ 저녁을 먹는 중에도 아배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니, 오늘 외박하냐?/ -아뇨, 오늘은 집에서 잘 건데요./ -그케, 니가 집에서 자는 게 외박 아이라?//
집을 자주 비우던 내가 어느 노을 좋은 저녁에 또 집을 나서자/ 퇴근길에 마주친 아배는/ 자전거를 한 발로 받쳐 선 채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야야, 어디 가노?/ -예… 바람 좀 쐬려고요./ -왜, 집에는 바람이 안 불다?//
그런 아배도 오래 전에 집을 나서 저기 가신 뒤로는 감감 무소식이다.
(졸시 ‘아배 생각’ 전문)
글 / 안상학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듯하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지고 나면 강을 건너는 순서만 남는다.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 그것이 순리다.
아버지는 화전민이었다. 소개령이 떨어져 쌀과 좁쌀 두어 되 보듬은 어머니와 자식 셋 이끌고 도시로 나와 밑바닥 인생을 걸었다. 채소 장수, 닭 장수, 막걸리 배달꾼 등을 하며 돈도 좀 마련하고 가게도 차려 사는 것처럼 살아본 세월이 얼마였나. 이내 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지자 가계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삼년 와병 끝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죽어라고 입을 벌리며 짹짹거리는 자식새끼뿐이었다.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고 아버지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면 된다고 정호승 시인이 말했던가. 어머니의 조각을 다시 붙일 수 없었듯이 아버지의 인생은 평생 조각난 채로 적자 인생으로 사셨다. 그렇게 좋았던 새어머니를 비명에 잃고, 성격이 유난해서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세 번째 새어머니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더하셨다.
흩어져 살던 자식들이 아버지의 근처로 모여 살 즈음, 아버지의 조각난 삶은 그 정도로도 모자랐던지 완벽히 부서지고 말았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석 달 식물인간으로, 다섯 해를 기억상실로 살다 가셨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선 부지런한 모습이 떠오른다. 온 집안 대소사는 모두 아버지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온 집안 어른들이 안타까워한 것도 그만한 일손을 집안에서 다시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당신 일도 마찬가지였다. 새벽에 논밭일 다 하고 아침에 출근해 온 동네 막걸리를 배달하고, 낮에는 농사, 저녁에는 다시 배달로 이어지던 일상이 사고를 당하는 날까지 하루 같았다.
지지리 복이 없고 가난한 아버지였지만 성격만큼은 낙천적이고 유머가 풍부한 분이셨다. 마을에서 관광버스를 맞춰 단풍놀이를 갈 때도 아버지가 유고 중이면 미뤘다. 단풍길이 빙판길이 되어도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을 좋아했다. 신명나고 재미있고 친화적인 아버지는 어떤 자리보다도 오남매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아버지의 개인기를 최상의 것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코로 젓가락을 타면 모든 악기 소리가 났다. 온몸이 악기였다. 노래는 또 얼마나 구성지게 넘기셨는지.
인심 좋고 부지런하고 낙천적이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과 평생을 같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 아버지를 오히려 이기려고만 했으니 후회막급이다. 농림고에 가라고 하실 때 인문계를 선택했으며, 시를 쓰면 굶어죽는다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라고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파렴치하게도 그렇게 배운 시로 아버지를 돌이켜 보자면 이렇다.
뻔질나게 돌아다니며/ 외박을 밥 먹듯 하던 젊은 날/ 어쩌다 집에 가면/ 씻어도 씻어도 가시지 않는 아배 발고랑내 나는 밥상머리에 앉아/ 저녁을 먹는 중에도 아배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니, 오늘 외박하냐?/ -아뇨, 오늘은 집에서 잘 건데요./ -그케, 니가 집에서 자는 게 외박 아이라?//
집을 자주 비우던 내가 어느 노을 좋은 저녁에 또 집을 나서자/ 퇴근길에 마주친 아배는/ 자전거를 한 발로 받쳐 선 채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야야, 어디 가노?/ -예… 바람 좀 쐬려고요./ -왜, 집에는 바람이 안 불다?//
그런 아배도 오래 전에 집을 나서 저기 가신 뒤로는 감감 무소식이다.
(졸시 ‘아배 생각’ 전문)
글 / 안상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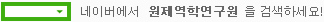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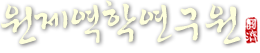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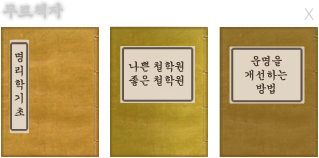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