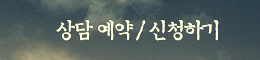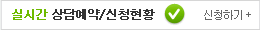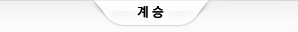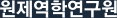한로절을 맞이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김태규 명리학] 한로절을 맞이하여
오늘이 한로다. 寒露란 ‘차가운 이슬’이 내리고 산간 지방에서는 이슬이 얼기도 하는 계절이라는 뜻이다. 한로부터 늦가을로서 봄 중에 가장 좋은 봄인 4월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을다운 가을이다. 4월과 10월은 계절적으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나들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오늘이 마침 한로인지라 절기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의 전통 달력인 음력은 정확히 말해서 태양태음력이다. 양력과 음력을 배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양력에 더 가까운 편인데, 이는 24절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절기라고 흔히 얘기들 하지만 사실은 24기(氣)라 해야 하며, 12절기(節氣)와 12중기(中氣)로 이루어진다. 24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맞추어 춘분점을 기준으로 황도를 동쪽으로 15도 이동할 때마다 하나의 기를 배당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쓰는 음력은 윤달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춘부터 시작하여 입하, 입추, 입동을 지나 다시 입춘으로 돌아오는 주기가 1 태양년이 된다. 이처럼 태양의 움직임에 맞추어져 있기에 절기가 드는 날은 양력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즉, 새해의 출발점인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경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의 한로는 양력으로 매년 10월 8일경이다. 하루가 앞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1년의 길이가 날의 정수배가 아니라 365.2424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기에 기준하여 달을 정하므로 사실상 우리가 쓰는 음력은 태양력의 성격이 강하며, 현재 전 세계가 쓰는 그레고리오력보다 우수한 점도 많다.
24기는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누어지는데, 절기는 매 양력 월 상순에 오고 중기는 대체로 하순에 온다. 절이란 마디라는 뜻으로서 달이 바뀌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면 오늘 10월 8일의 한로는 절기이고 10월 23일의 상강은 중기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1년을 4계(季)로 나누고 1계를 3개월로 한다. 그래서 계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1개월은 절기와 중기의 2기(氣)로 나누어지고, 1기는 3후(候)로 나눈다. 1기는 대략 15일이니 후는 5일이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후(氣候)라는 말은 이 기와 후를 붙여쓰는 말이다.
사극 드라마에 보면 가끔 ‘문후를 여쭈어라’ 라는 말이 나온다. 원래 문후(問候)란 최근 5일간, 즉 며칠새 건강이 어떠신지요 하는 뜻이다. 그런데 이 후에 대해서는 오늘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알아두면 계절 변화를 5일 단위로 관찰하는 묘미를 맛볼 수 있다. 후는 결국 일년을 5일로 나눈 것이니 72후가 된다.
가령 이 달 술(戌)월은 한로로부터 세 개의 후가 이어지고, 상강부터 세 개의 후로 이어진다. 세 개의 후를 초후, 중후, 말후라고 하는데, 백로부터 초후는 홍안래빈(鴻雁來賓)이니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가 잔치에 초대받은 듯 모여든다는 것이고, 중후는 작입대수위합(雀入大水爲蛤), 참새가 줄어들고 강에서는 조개가 흔해진다는 말이다. 말후는 국유황화(菊有黃華), 즉 국화꽃이 노랗게 핀다는 말이다.
다시 서리 내리는 상강부터 초후는 시내제수(豺乃祭獸)이니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중후는 초목황락(草木黃落)이니 잎새들이 누렇게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하며, 말후는 칩충함부(蟄虫咸俯)이니 벌레들이 동면하기 위해 땅속으로 숨어든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5일 단위마다의 자연 현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72후의 내용은 원래 회남자(淮南子)라는 책에 실려있으며, 조선조에 출간된 역법 서적인 ‘칠정산내편’에도 옮겨져 있다.
72후의 내용을 다 알아보기에는 양이 만만치 않아, 일부만 소개했지만, 이처럼 5일 단위로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다른 문화권에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하지만, 12개월의 명칭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입춘에 시작하는 정월부터 2월, 3월은 맹춘(孟春), 중춘(仲春), 계춘(季春)이라 하는데, 孟은 처음이라는 뜻이고, 仲은 둘째 또는 가운데 라는 의미, 季는 끝이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4월부터 6월까지는 맹하, 중하, 계하가 되고 7-9월은 맹추,중추,계추, 10-12 월은 맹동, 중동, 계동이라 한다.
또 월마다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다. 일부를 알아보면 가령 이 달 술월의 별칭은 국화가 피는 달이라 해서 국월(菊月), 감상이 일어 시 짓기 좋으니 영월(詠月), 가을저녁의 분위기가 쓸쓸하다 해서 모추(暮秋), 하늘이 높다 해서 고추(高秋) 등등이 있다.
이처럼 월마다 운치있는 별칭들이 있는데, 음력 8월의 별칭들도 아주 멋이 있다. 가을 달빛이 좋은 달이라 관련 명칭이 주로 달과 관련된 것들이다. 살펴보면 옥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는 계월(桂月), 달빛이 교교하다 해서 교월(皎月), 달빛이 희고 밝다 해서 소월(素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월은 우리에게 각별한 명칭이다.
우리 서정을 노래한 시인 김소월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시인 김소월은 본명이 김정식이지만, 이 달에 출생했기에 예명을 소월이라 했음이 분명하다. 참 멋들어진 이름이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김소월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자. 독자분들도 별호를 하나 지을 것 같으면 태어난 생월의 별칭을 알아보아서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하는 것도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월은 생일이 1902년 8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예명이 素月이니 음력 생일임이 확실하다.
년 壬寅
월 戊申
일 癸巳
시 --
매 2세마다 맞이하는 대운은
02 己酉
12 庚戌
22 辛亥
32 壬子
달은 음력 8월이지만, 절기로 기준하면 신월이 되어 무신월 생이다. 월간에 무토 정관(正官)이 있고, 월지에 신금 정인(正印)이 있으니 금백수청(金白水淸)한 사주로 문예에 재능이 있다.
아쉬운 것은 사람됨이 너무 얌전하고 대인 관계가 서툴다는 흠이 있어 보인다. 생시를 몰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지지 배열이 寅申巳로 되어 있어 운명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는 징조가 암시되어 있다.
평북 출생으로 고향에서 오산학교를 거쳐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도쿄상대에 입학하였으나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당시 오산학교 교사였던 안서(岸曙) 김억(金億)의 지도 아래 시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1920년, ‘낭인(浪人)의 봄’, ‘야(夜)의 우적(雨滴)’, ‘그리워’ 등을 ‘창조(創造)’지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는데, 庚申년이니 윗분의 도움으로 등단하는 운이다.
대표작이자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격인 ‘진달래꽃’은 1922년 ‘개벽’ 7월호에 발표하여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 해가 壬戌년 丁未월이니 인정을 받아 자신감이 생기며, 수확도 큰 해라는 의미다.
그 후에도 계속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등을 발표하였고, 1924년 갑자년에는 갑목 식신운(食神運)이라 시인의 재능이 최대로 발휘되니, 불후의 명작 ‘산유화(山有花)’를 비롯하여 일련의 명작들을 발표하였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해에 발표한 시들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본다.
1925년, 을축년에는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이 책으로 간행되었다.
그후 고향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하였으나 운영에 실패하였고, 실의의 나날을 술로 달래야 했다. 소심하고 여린 김소월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대운이 辛亥운이라 사업하기에 좋은 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33세 되던 1934년 12월 23일 부인과 함께 통음하였는데, 이튿날 음독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 때가 甲戌년 丙子월 己巳일이었는데, 기토 편관이 들어와 우울증과 염세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사망 시각은 음양 오행으로 따져볼 때, 새벽 자정 무렵으로 생각된다.
필자 생각에 그가 죽지 않고 더 살았더라면, 실은 32세 임자 대운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욱 왕성한 시작 활동으로 우리 문단을 빛내었을 것이며, 본인도 적지 않은 삶의 영화를 누렸을 터인데 여린 감성의 시인이 일시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으니 그 또한 운명이라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감이 든다.
김소월은 불과 5, 6년 남짓의 짧은 시작 활동을 하였으나, 분명 그는 당대의 대단한 천재 시인이었으며, 그의 시가 지닌 짙은 향토성과 우리 전래의 서정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 중에서 늦가을의 감상을 노래한 시 한 편을 함께 감상해 보기로 하자.
‘가을 아침에’
어둑한 퍼스렷한 하늘 아래서
회색(灰色)의 지붕들은 번쩍거리며,
성깃한 섭나무의 드문 수풀을
바람은 오다가다 울며 만날 때,
보일락말락하는 멧골에서는
안개가 어스러히 흘러 쌓여라.
아아 이는 찬비 온 새벽이러라.
냇물도 잎새 아래 얼어붙누나.
눈물에 쌓여 오는 모든 기억(記憶)은
피흘린 상처(傷處)조차 아직 새로운
가주난 아기같이 울며 서두는
내 영(靈)을 에워싸고 속살거려라.
그대의 가슴속이 가볍던 날
그리운 그 한때는 언제였었노!
아아 어루만지는 고운 그 소리
쓰라린 가슴에서 속살거리는,
미움도 부끄럼도 잊은 소리에,
끝없이 하염없이 나는 울어라.
우리의 전통 달력인 음력은 정확히 말해서 태양태음력이다. 양력과 음력을 배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양력에 더 가까운 편인데, 이는 24절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절기라고 흔히 얘기들 하지만 사실은 24기(氣)라 해야 하며, 12절기(節氣)와 12중기(中氣)로 이루어진다. 24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맞추어 춘분점을 기준으로 황도를 동쪽으로 15도 이동할 때마다 하나의 기를 배당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쓰는 음력은 윤달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춘부터 시작하여 입하, 입추, 입동을 지나 다시 입춘으로 돌아오는 주기가 1 태양년이 된다. 이처럼 태양의 움직임에 맞추어져 있기에 절기가 드는 날은 양력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즉, 새해의 출발점인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경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의 한로는 양력으로 매년 10월 8일경이다. 하루가 앞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1년의 길이가 날의 정수배가 아니라 365.2424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기에 기준하여 달을 정하므로 사실상 우리가 쓰는 음력은 태양력의 성격이 강하며, 현재 전 세계가 쓰는 그레고리오력보다 우수한 점도 많다.
24기는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누어지는데, 절기는 매 양력 월 상순에 오고 중기는 대체로 하순에 온다. 절이란 마디라는 뜻으로서 달이 바뀌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면 오늘 10월 8일의 한로는 절기이고 10월 23일의 상강은 중기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1년을 4계(季)로 나누고 1계를 3개월로 한다. 그래서 계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1개월은 절기와 중기의 2기(氣)로 나누어지고, 1기는 3후(候)로 나눈다. 1기는 대략 15일이니 후는 5일이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후(氣候)라는 말은 이 기와 후를 붙여쓰는 말이다.
사극 드라마에 보면 가끔 ‘문후를 여쭈어라’ 라는 말이 나온다. 원래 문후(問候)란 최근 5일간, 즉 며칠새 건강이 어떠신지요 하는 뜻이다. 그런데 이 후에 대해서는 오늘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알아두면 계절 변화를 5일 단위로 관찰하는 묘미를 맛볼 수 있다. 후는 결국 일년을 5일로 나눈 것이니 72후가 된다.
가령 이 달 술(戌)월은 한로로부터 세 개의 후가 이어지고, 상강부터 세 개의 후로 이어진다. 세 개의 후를 초후, 중후, 말후라고 하는데, 백로부터 초후는 홍안래빈(鴻雁來賓)이니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가 잔치에 초대받은 듯 모여든다는 것이고, 중후는 작입대수위합(雀入大水爲蛤), 참새가 줄어들고 강에서는 조개가 흔해진다는 말이다. 말후는 국유황화(菊有黃華), 즉 국화꽃이 노랗게 핀다는 말이다.
다시 서리 내리는 상강부터 초후는 시내제수(豺乃祭獸)이니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중후는 초목황락(草木黃落)이니 잎새들이 누렇게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하며, 말후는 칩충함부(蟄虫咸俯)이니 벌레들이 동면하기 위해 땅속으로 숨어든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5일 단위마다의 자연 현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72후의 내용은 원래 회남자(淮南子)라는 책에 실려있으며, 조선조에 출간된 역법 서적인 ‘칠정산내편’에도 옮겨져 있다.
72후의 내용을 다 알아보기에는 양이 만만치 않아, 일부만 소개했지만, 이처럼 5일 단위로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다른 문화권에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하지만, 12개월의 명칭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입춘에 시작하는 정월부터 2월, 3월은 맹춘(孟春), 중춘(仲春), 계춘(季春)이라 하는데, 孟은 처음이라는 뜻이고, 仲은 둘째 또는 가운데 라는 의미, 季는 끝이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4월부터 6월까지는 맹하, 중하, 계하가 되고 7-9월은 맹추,중추,계추, 10-12 월은 맹동, 중동, 계동이라 한다.
또 월마다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다. 일부를 알아보면 가령 이 달 술월의 별칭은 국화가 피는 달이라 해서 국월(菊月), 감상이 일어 시 짓기 좋으니 영월(詠月), 가을저녁의 분위기가 쓸쓸하다 해서 모추(暮秋), 하늘이 높다 해서 고추(高秋) 등등이 있다.
이처럼 월마다 운치있는 별칭들이 있는데, 음력 8월의 별칭들도 아주 멋이 있다. 가을 달빛이 좋은 달이라 관련 명칭이 주로 달과 관련된 것들이다. 살펴보면 옥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는 계월(桂月), 달빛이 교교하다 해서 교월(皎月), 달빛이 희고 밝다 해서 소월(素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월은 우리에게 각별한 명칭이다.
우리 서정을 노래한 시인 김소월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시인 김소월은 본명이 김정식이지만, 이 달에 출생했기에 예명을 소월이라 했음이 분명하다. 참 멋들어진 이름이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김소월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자. 독자분들도 별호를 하나 지을 것 같으면 태어난 생월의 별칭을 알아보아서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하는 것도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월은 생일이 1902년 8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예명이 素月이니 음력 생일임이 확실하다.
년 壬寅
월 戊申
일 癸巳
시 --
매 2세마다 맞이하는 대운은
02 己酉
12 庚戌
22 辛亥
32 壬子
달은 음력 8월이지만, 절기로 기준하면 신월이 되어 무신월 생이다. 월간에 무토 정관(正官)이 있고, 월지에 신금 정인(正印)이 있으니 금백수청(金白水淸)한 사주로 문예에 재능이 있다.
아쉬운 것은 사람됨이 너무 얌전하고 대인 관계가 서툴다는 흠이 있어 보인다. 생시를 몰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지지 배열이 寅申巳로 되어 있어 운명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는 징조가 암시되어 있다.
평북 출생으로 고향에서 오산학교를 거쳐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도쿄상대에 입학하였으나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당시 오산학교 교사였던 안서(岸曙) 김억(金億)의 지도 아래 시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1920년, ‘낭인(浪人)의 봄’, ‘야(夜)의 우적(雨滴)’, ‘그리워’ 등을 ‘창조(創造)’지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는데, 庚申년이니 윗분의 도움으로 등단하는 운이다.
대표작이자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격인 ‘진달래꽃’은 1922년 ‘개벽’ 7월호에 발표하여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 해가 壬戌년 丁未월이니 인정을 받아 자신감이 생기며, 수확도 큰 해라는 의미다.
그 후에도 계속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등을 발표하였고, 1924년 갑자년에는 갑목 식신운(食神運)이라 시인의 재능이 최대로 발휘되니, 불후의 명작 ‘산유화(山有花)’를 비롯하여 일련의 명작들을 발표하였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해에 발표한 시들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본다.
1925년, 을축년에는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이 책으로 간행되었다.
그후 고향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하였으나 운영에 실패하였고, 실의의 나날을 술로 달래야 했다. 소심하고 여린 김소월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대운이 辛亥운이라 사업하기에 좋은 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33세 되던 1934년 12월 23일 부인과 함께 통음하였는데, 이튿날 음독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 때가 甲戌년 丙子월 己巳일이었는데, 기토 편관이 들어와 우울증과 염세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사망 시각은 음양 오행으로 따져볼 때, 새벽 자정 무렵으로 생각된다.
필자 생각에 그가 죽지 않고 더 살았더라면, 실은 32세 임자 대운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욱 왕성한 시작 활동으로 우리 문단을 빛내었을 것이며, 본인도 적지 않은 삶의 영화를 누렸을 터인데 여린 감성의 시인이 일시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으니 그 또한 운명이라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감이 든다.
김소월은 불과 5, 6년 남짓의 짧은 시작 활동을 하였으나, 분명 그는 당대의 대단한 천재 시인이었으며, 그의 시가 지닌 짙은 향토성과 우리 전래의 서정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 중에서 늦가을의 감상을 노래한 시 한 편을 함께 감상해 보기로 하자.
‘가을 아침에’
어둑한 퍼스렷한 하늘 아래서
회색(灰色)의 지붕들은 번쩍거리며,
성깃한 섭나무의 드문 수풀을
바람은 오다가다 울며 만날 때,
보일락말락하는 멧골에서는
안개가 어스러히 흘러 쌓여라.
아아 이는 찬비 온 새벽이러라.
냇물도 잎새 아래 얼어붙누나.
눈물에 쌓여 오는 모든 기억(記憶)은
피흘린 상처(傷處)조차 아직 새로운
가주난 아기같이 울며 서두는
내 영(靈)을 에워싸고 속살거려라.
그대의 가슴속이 가볍던 날
그리운 그 한때는 언제였었노!
아아 어루만지는 고운 그 소리
쓰라린 가슴에서 속살거리는,
미움도 부끄럼도 잊은 소리에,
끝없이 하염없이 나는 울어라.
출처 : [김태규 명리학] 한로절을 맞이하여 - cafe.daum.net/dur6fk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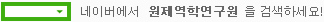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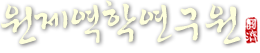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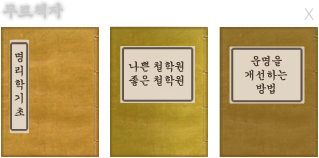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